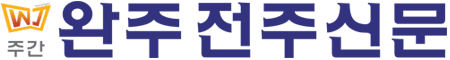more
 홈
오피니언
홈
오피니언
대문 밖 너른 마당(344회-통합 749회) : 좋은 터, 살고 싶은 마을
admin 기자
입력 2021.12.03 09:26
수정 2021.12.03 09:26
좋은 터, 살고 싶은 마을
 | |
| ↑↑ 이승철 = 칼럼니스트 | |
| ⓒ 완주전주신문 |
△화산면 원종리. 이 마을은 산-들-큰 길이 가까워 ‘마루 종(宗)’자 종리(宗里)라 할 만하다. 근세에 신암 김정만(1880-1955) 선생이 사셨다. 김 선생은 간재 전우 대학자의 제자로 20살 전에 『4서3경』을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외운 호남 북부의 으뜸 유생이었다.
오경목(1867-1946) 씨는 1907년 16인이 모여 교회를 열었는데 오늘날의 종리교회로 이연규, 이남규, 김득환, 김순회, 오병암 목사가 여기 출신이며, 근래 이야기로는 판사(순천박씨, 밀양박씨), 검사(경주이씨), 변호사(경주김씨)가 나와 ‘이 마음에 들려 공부 잘하는 체 하지마라’는 소리가 있다.
△이웃 가양리(갱이)는 어떤가? 안동김씨 집성촌으로 자손이 번창, 수가 많고 촌수(寸數)가 가까우며 부지런하다. 일정시대에 자기토(自己土)와 소작 농사를 하여 살림이 탄탄했으며 단결심이 강하고 성실하여 ‘누구나 갱이 와서 살림 잘하는 체 하지 마라.’는 말이 있었다.
△농상(용수마을)·농하(용소마을)는 저수지 물길이 좋고 신작로(新作路:17번국도)가 가까워 살기 좋다. 부자(구연직) 동네이므로 남자 여자 논일 밭일을 잘 한다. 성실성이 한눈에 보인다. 그러므로 ‘용소마을에 가서 일 잘하는 체 하지마라.’는 조언이 있었다.
△궁평(궁뜰)은 700석 지주 마을이다. 큰보들 가운데 동네로 아침에 해 일찍 돋고 늦게 진다. 박노룡·박헌성은 일본 유학을 다녀왔으며 해방이후 전주공업(박헌화·박헌복), 북중(박하규·박왕규·박윤규), 신흥(박점규), 금산농(김치회), 이리공(임진영), 완주중(곽동훈), 사범대(이승철)를 다닌 학생이 많았다. 1970년대 이야기이다.
“궁평은 면장 할 사람은 많으나 이장 반장 할 인물은 없다. 그러므로 궁들에서 아는 체하지마라”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다. 개성이 뚜렷하여 단합하기 어렵다는 속뜻을 지녔다.
와룡리 중뜸보 언덕의 술집(장인복)은 상와-가양-하와-후동에서 거의 같은 거리이다.
술 한 되(1.8리터)를 불러 둘이 마시면 좋았고, 세 사람이 두 되는 좀 과한 편이었다. 안주는 배추김치이고, 여기에 두부나 오징어 특히 돼지고기 냄비가 오르면 술값은 하루 품삯에 해당했다.
계절 따라 고향 길-마음 따라 골목길을 즐긴다. 수수목이 팰 무렵이면 앞내 뒷내에 살을 매어 참게를 잡던 김재송·김봉회씨는 실력 있는 어부(?)로 하룻밤에 수백 마리를 잡았다. 먹다먹다 못다 먹으면 게장(젓)을 담갔는데 맛이 좋아 밥 한 그릇을 후닥닥 먹어 치웠고, 맛은 짠 편이라 밥보다 물을 더 마셔 배가 팽팽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가는 신세…’ 1970년대 야반도주를 하고 그냥 그대로 눈을 감은 사람들의 이름은 빼었다. 모두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 이승철 = 칼럼니스트,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저작권자 완주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