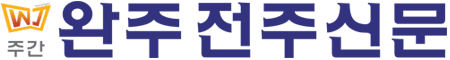홈
오피니언
홈
오피니언
대문 밖 너른 마당(520회-통합 925회) : 땔감과 아궁이 변천사(變遷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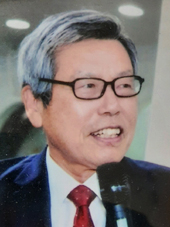 | |
| ↑↑ 유하당(柳河堂)=칼럼니스트 | |
| ⓒ 완주전주신문 |
아궁이에 불 피우는 재료를 땔감이라 하며, 산·들에서 거둬들이는 데 △‘싸 잽이’는 마른 풀, 푸른 가지, 나뭇잎 닥치는 대로 얼른 뜯어온 것이요. △‘갈퀴나무’는 주로 솔잎을 긁어모아 네모지게 묶어지고 왔다.
△‘청산이’는 푸른 소나무 가지를 쳐 온 것이고 △‘삭정이’는 나뭇가지 마른 걸 말하며 △‘풋나무’는 푸른 나뭇잎이요.
△‘장작’은 나무토막 쪼갠 것, 잉걸불에 물 뿌려 숯을 만들었고 △고추·목화·깻대는 물론 나뭇잎도 긁어다 때니 아궁이는 쓸 만한 것만 빼고 다 처지르는 소각장이다.
부잣집은 짚 누리가 컸고, 가난하면 허청 바닥 긁어다 국 끓이고 밥 지었다. 부자보다 가난한 집안 땔감이 많이 드는 이유는 나물·시래기를 삶고 죽을 끓이니 더 들 수밖에.
△지금 젊은이들 ‘굴뚝’ 이 말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흰 개꼬리 굴뚝에 3년 넣어둬도 그대로 희다.’ 형제간에 혼인 순서 바뀌어 아우 먼저 장가들면 ‘그 집 굴뚝에 불 땐다’ 이런 말이 있었으나 지금 청년들 익숙치 못하다.
국회의원 가운데도 더러 있을 것이다. 소위 사모님 부대는 말 할 게 없고…, 난 여덟 살 때 밤 잎 긁어 가마니에 넣어 지고 오면 식구들이 ‘한 끼 밥은 하겠다.’며 대견스럽게 여기는 말에 재미 붙였던 동네 아기나무꾼이었다.
한약 달일 때 화덕·풍로가 쓰였고, 살림 잘하는 집은 무쇠로 된 ‘아궁이 문’이 있어 방 보온과 재나 불씨 관리에 유리했다. 보리 꺼럭·왕겨 땔 때에는 풀무질을 했고, 허청에 나무 떨어진 집은 쌀독도 비었으며, 울타리 허술할수록 토방에 신발이 많았다.
시골 화재는 잿간에서 자주 났다. 재에 불씨 담겨나가면 슬슬 살아나 이 시대 구호 ‘꺼진 불도 다시 보자’이었다. 1950년대 자취생은 심지가 여럿인 석유 곤로를 썼고, 1960년대 산림녹화를 부르짖으며 연탄이 등장했다. 도시 주택 연탄 수레, 똥 구루마(일본어:くるま) 들어오면 ‘좋은데 산다.’고 했다.
지금은 도시가스로 밥은 물론이고 더운 물이 펑펑 나와 온천 갈 필요가 없다. 가스레인지 이것 좋다. 요새 새집 지으면 전기로 열을 내는 ‘인덕션 레인지’를 설치하나 노인들 이름 부르기 서툴고 또한 작동법을 잘 몰라 더듬거린다.
예전 같으면 집 앞 엽순공원 솔잎·나뭇잎 모두 땔감이며, 산책로에 쌓인 낙엽 쓸어 가면 당국에서 고맙다고 봉사상 줄 것이나 아궁이가 있어야지!. 노인들과 수입 적은 집안 식구들은 낮에 집 나가며 ‘가스보일러 끄고 가냐?’, ‘외출로 놓고 가냐?’, ‘켜두고 가냐?’ 각기 다른 생각 토론이 심하다.
겨울 한 달 도시가스요금 60만원 가슴이 철렁한다. 손발시린 사람 어찌할꼬. 직장 이래서 소중하다. 여름 불 앞에서 일하는 ‘젊은이여! 노인들 여름살기가 낫다’는 이 말 노여워하지 마라. 화로 얘기는 줄인다.
/ 유하당(柳河堂) = 前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