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 |
| ⓒ 완주군민신문 |
외가에선 외숙모 눈치 보며 산다. 다정한 친구가 일 풀릴 때까지 함께 지내자며 붙드는 우정이야 말할 수 없이 고마우나 부인 눈치를 보아야 한다.
시골 사람 도시에 나가면 친척집 찾아갔고 잠까지 잤다. 이게 옛날 흔했던 일로 주인은 큰 고생이었다.
『1954년 아버지가 위독해 모시고 예수병원에 갔으나 입원실이 없어 환자가 복도에서 잤다. 함께 온 맏딸은 부득이 화원동(지금 경원동) 진외가(陳外家)에 갔다. 좁은 집에 대가족 전쟁 직후라 식량 사정이 나쁜 시절이었다.
며칠 동안 밥 먹고 잤다. 갖갖으로 입원실에 들어갔으나 병이 너무나 위중해 치료가 어렵다는 것이다. 딸은 속수무책 어쩔 바를 모르고 흐느낄 때 박병래 씨는 딱한 처지를 외면치 않고 차를 주선해 경각지경의 환자를 당시 논산군 구자곡면 시묘리까지 보내줬다.
결국 그해 10월 환자는 죽었고 집안에서는 스무 살 노처녀(?)가 섣달을 넘길 수 없다며 시집보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셔 숙부가 살림을 돌보았고 신랑은 아직 학생이었다. 젊은 새댁은 결국 살림 속에 파묻혀 아들 딸 낳다보니 어느덧 70을 넘었다.
진외가 박병래 오빠를 만나 고마웠다는 말 한 마디 인사하기가 평생 소원이었다. 다소나마 보은을 하려고 친한 사람 앞에서 실토하며 외가에 수소문을 청했으나 매양 허사였다.
방송국을 찾을까도 생각했으나 이산가족이 워낙 많은 세상이라 용기를 내지 못하다 보니 어느덧 일흔아홉 살 만날 가망이 희미해지고 오빠 역시 80대 후반 기다려줄 나이가 아니라며 흐느낀다.』 지금도 찾는 중이다.
신세 지은 사람 잊지 않고 찾는 도덕성이 무척 아름답다. 실력 있는 젊은 청년들이 눈치 보며 밥 먹는 세상은 바뀌어야한다.
실업자·무직자의 슬픈 눈빛이 안타깝다. 허허! 경로당에서도 눈칫밥이 있단다. 눈칫밥도 문제지만 눈치 없는 사람 역시 걱정이다.
/이승철=국사편찬위/史料조사위원(esc2691@naver.com)
저작권자 완주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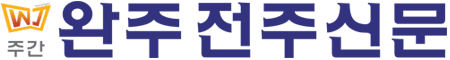



 홈
오피니언
홈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