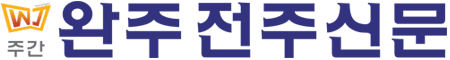more
 홈
오피니언
홈
오피니언
대문 밖 너른 마당(345회-통합 750회) : 큰 뿌리 박태근(朴泰根)
admin 기자
입력 2021.12.10 09:37
수정 2021.12.10 09:37
큰 뿌리 박태근(朴泰根)
 | |
| ↑↑ 이승철 = 칼럼니스트 | |
| ⓒ 완주전주신문 |
박태근 옹의 아호가 비봉(飛鳳), 이름 태근은 ‘큰 뿌리’라는 의미를 지녔다. 1950년대 먹고 살기 위하여 서울에 올라가 ‘월남자’, 피난 다녀온 ‘난민’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 틈에서 목구멍을 타고 오르는 똥물을 되삼키며 살았다.
어려운 출판업(한신문화사)을 오래했고, 인문서적을 만들다보니 박사·석사 교수를 상대하는데 교수는 까다로운 편이다. 원고료가 비싸며, 명절-애경사-출판기념일에 봉투를 들고 가 눈도장을 찍어야 하는 기업이다.
70대 중반 사업을 정리하고 고향 평지마을에 돌아왔다. 주민마다 양로당을 갈망하며 터 걱정을 하자 ‘그럼 우리 밭에 지어라’ 옥토를 내줬다.
방황하던 어린 시절 전주 친구 집에서 몇 밤을 자고 밥을 얻어먹은 그걸 잊을 수가 없어 그의 손자에게 장학금 9천만 원을 줬다.
초등학교 동창생이 중학교 교장이다. 자기가 교장이 된 듯이 좋아 음향 시설을 해주었고 장학금도 듬뿍 건넸다. 70대 사귄 친구가 사경에 이르자 살리려고 약값을 뭉떵 보냈다. 고산 사람 윤재봉이 면장으로 오자 업무비에 쓰라며 두툼한 돈 봉투를 내놓았다.
종중회장을 맡아 여러 기의 묘를 이장하고 사초하며 비도 세웠다.
외아들은 타도에 살고 손자는 미국에서 공부 중이며 중년 두 딸은 살림 이외엔 눈 팔 틈이 없다.
집안 일가 박호근 씨가 귀에 대고 무어라고 하니 승낙을 곧 하여 천년향화지지에 치표를 했고 비석까지 세웠다. 긴 설명은 없었지만 자손들을 위한 대비책으로 보인다.
『비봉면지』에 실린 젊은 때의 사진은 땅딸막한 키에, 쩍 벌어진 어깨와 가슴, 둥근 얼굴, 야무진 체구, 검은 머리가 사업가로서 완벽한 체구이다.
『천곡단지 번역본』 서문을 남긴 걸 자랑스러워한다. 얼마 전까지 보던 중앙지를 정리하고 고향의 주간지와 월간지(완주전주신문, 완두콩 등)를 읽는다. 기생이 따르던 술잔을 기울이던 박태근 옹도 부인이 서울 가면 컵 라면에 더운물을 부어 후루룩 마시고 자리에 눕는다.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친구들은 늙어 많이 갔다. 이게 외로움이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한일이 훨씬 많다. 산에 옛 절터가 있고 이를 사려는 불도가 사정을 하자 시세의 3분의 1을 깎아주었다.
이 글을 쓰는 게 예의이다. ‘비봉포란’을 띄워야 주민의 도리이다. 코로나 19로 주저앉은 젊은이는 일어나야 한다. 다급한 분에게 교훈이 될 것이다. 마을 앞엔 ‘만권당(萬卷堂) 박태근 공적비’가 수문장처럼 우뚝 서있다. 조동수 씨는 자주 찾아 안부를 묻고, 건강을 살펴 준다. 사람은 준대로 거둔다.
/ 이승철 = 칼럼니스트,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저작권자 완주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