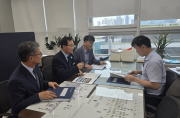more
고향 옛 동무들
 | |
| ↑↑ 연당 이숙자 수필가 | |
| ⓒ 완주전주신문 |
칠십 평생 단 한 번도 잊어 본적이 없었던 고향과 동무들, 금년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찾아가 봤다.
옛 시골 정취를 온몸에 느끼며 오솔길로 접었다. 동네 어귀에 검푸른 넓적한 바위 3개가 장승처럼 여전이 지키고 있었다.
내가 살던 45년 전의 자갈과 황토 길은 온 데 간 데 없다. 동네 앞 쉼터는 모종 마을 식구들이 정담을 나누고 대소사를 논의 했던 곳이다. 고샅길에 들어서자 서리오기 전에 딴 붉은 고추가 멍석에 누워 나를 빤히 바라본다.
뒷동산에 커다란 묘 봉 2개는 세월의 무게로 아주 납작 해졌다.
유일한 밤 동무인 휘황 찬 달이 우리들을 불러내면 가수들의 흉을 내며 춤을 추던 추억이 생각나 실 웃음이 났다.
어린 시절과 사춘기, 그리고 처녀시절의 필름을 꺼내 당겨 본다. 봄철에는 새벽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마을에서 징소리가 나면 산 너머로 산 너물을 뜯으러 간다.
우리들은 등불을 들고 산에 올라가 목청껏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면 대답 소리가 들리곤 했다.
그 뒤로 언제 그렇게 부모님을 불러 보았던가? 하나같이 궁상스럽고 가난한 냄새뿐인데 그 시절이 생각난다.
동네를 돌아보고 내가 살던 집으로 가보았다. 덜컹대던 양철 대문도 탱자나무 울타리도 왕 대밭에 참새소리도 흔적조차 없고, 내 출생 날 심었던 오동나무도 사라지고 툇마루 한 조각만이 나를 반기니 울컥 세월은 아무것도 지켜주지 않는구나.
안방 자리에 등잔불이 파르르 떨다 깜빡대는 정경이 아스라이 펼쳐진다.
허청 지붕위에 영롱하게 핀 은빛 박꽃 옆에 동실한 조롱박 한 폭의 정물화도 달이 흐르면 오동나무 잎 새가 움직이는 그림자 되고, 토방 돌 틈에 채송화는 잠이 든다.
풀 섶에서 울어대는 풀벌레는 나를 마루 기둥에 앉힌다. 내일의 희망을 꿈꾸란다. 언제나 달은 나를 유혹하고, 별이 내 가슴에 떨어져라 기도하며 성숙하게 철이 들었던 시절, 텃밭에 떨어진 이슬방울이 놀라서 별 지는 밤,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지요.
동무들 목소리라도 듣고 싶고, 만나고 싶다. 그립고 보고 싶은 얼굴들을 상기하며 세월의 무상함에 젖어 본다. 돌아오는 고샅길에서 동무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연당 이숙자 작가는 완주 봉동읍 출생으로, 지난 1998년 지구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서예 문인화 초대작가이자 전북문인협회와 완주문인협회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 낭송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전북향토작가로 선정됐으며, 2010년 ‘늦은 햇살이 아름답다’와 2018년 ‘작은 들꽃도 아름답다’ 등의 문집을 냈다.
저작권자 완주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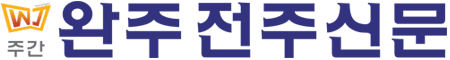



 홈
오피니언
홈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