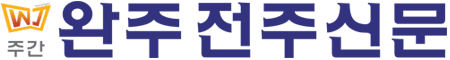more
 홈
오피니언
홈
오피니언
대문 밖 너른 마당(460회-통합 865회) : 좋고 싫음의 비교 기준(比較基準)
admin 기자
입력 2024.04.12 10:26
수정 2024.04.12 10:26
좋고 싫음의 비교 기준(比較基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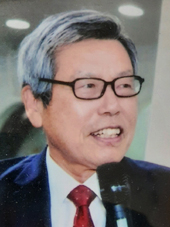 | |
| ↑↑ 유하당(柳河堂)=칼럼니스트 | |
| ⓒ 완주전주신문 |
△긍정적인 걸 물으니 소 좋다↔말 좋다=각각 15%, 계 30%. 나머지 10%는 이렇고 저렇고 대답을 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후한 가정 소리를 못 듣는 집안이다.
마·소 거북하게 여기는 쪽은 먼데서 바라만 본다. 그러기에 머슴 구하기 어렵고 일할 놉도 귀하며, 잔치를 베풀어도 모여들지를 않는다. 그렇다고 ‘소·말 팔아버리라’ 이럴 수야 없다. 그 집 살림이요, 자산이기에 그냥 보며 지나는 게다.
이런 결과로 농사 부실함을 주인이 잘 알면서도 운명이려니 그냥 지나친다. 사돈네도 인심과 여론을 아나 말붙이기를 꺼린다. 화낼까 봐서…. 동창생끼리도 ‘출세 상위 급 모두 인기 좋다’는 말 듣기 어렵다.
△전주 모래내에서 오래 살았다. 마침 지나던 이가 쪽지를 보이며 ‘여기가 어디요’ 묻는다. 메모지에 ‘과부피 내래모’이다. 처음 듣는 말이라 대답을 못하니 남들도 마찬가지란다. 마침 그때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여학생에게 물으니 망설임 없이 “예! 저기 저 집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간판을 보니→‘모래내 피부과’이다. 기가 막혀 껄껄껄 웃고 헤어졌다.
△그 다음날이다. 예쁜 여자가 내미는 명함 뒷면의 글씨 ‘과부피운다름아’이다. 어제 일이 생각나 자신 있게→“이건 ‘아름다운피부과’입니다.”, “의사 박정훈이구요.”
이 여인의 말 “선생님이 열 번째인데, 어떻게 그리도 잘 아십니까?”, “나 조상 대대로 700년 전주 사는 ‘이무기’라 그렇습니다.” 여인은 신기하고 절묘하다며 ‘아름다운 피부과’를 거처 ‘이무기 님’을 만나려는데 이게 원 일입니까?” 손을 덥석 잡으려든다.
나 이 여인에게 상당히 끌려들어갔음을 알아차리고 “내 이름 ‘esc’입니다.”하니 “왜 아까 ‘이무기’라 하셨어요?” 되묻는다. “이무기란 ‘용 되지 못한 상태의 동물’인데 나 90 넘어 운전 못하니 ‘이무기’일 뿐이라”고 설명을 했다.
△이웃사촌이 40살 넘어 늦게 시집간 딸(손보기)에게 손편지를 보냈다. 글씨체나 문장 부녀간의 정이 펄펄 넘쳐난다. 퇴근한 남편은 편지를 두루 읽고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아 눈치를 살피며 슬쩍 물으니 화를 꾹 참는 듯 “이 샛서방이 누구요?”, “…늦게 혼인했으므로 ‘샛서방 잘 살피며 탈 없이 살아라.” 이 대목이 문제이었다.
남편 화 날 만하다. ‘샛서방’이란 자기 남편 아닌 불온한 짓하는 딴 남자 아닌가. 신혼 내외와 아버지 큰일 날 뻔했다. ‘새서방’에 ‘ㅅ 받침’이 들어가→‘샛서방!’이 되었다.
말·글 이렇게 어려운데 국회의사당이나, 여야 중앙당본부의 험한 말이 먹구름처럼 세상을 뒤덮기가 일상이다. 언론도 지쳤나 속수무책. 거꾸로 읽어도 당혹하는데 말 함부로 하는 자는 ‘손보기’를 해야 한다. ‘손보기가 투표’이다. ‘진실한 사람’을 찾아라.
/ 유하당(柳河堂) = 前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저작권자 완주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