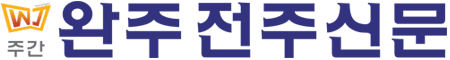more
 홈
오피니언
홈
오피니언
(기고 - 수필) 겨울이 남긴 따뜻한 목소리
admin 기자
입력 2022.02.18 10:53
수정 2022.02.18 10:53
겨울이 남긴 따뜻한 목소리
 | |
| ↑↑ 이영화 시인 | |
| ⓒ 완주전주신문 |
길고양이 발도장이 올개졸개 마중 나와 있고, 바싹 마른 나무들 흰 누비옷 하나 생겨 어깨 두둑하고, 온 세상이 살포롬 차렵이불 덮어 하얗게 반짝거리고 있었다.
들추어보니 추운 겨울은 오히려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리는 캐럴에 맞춰 화려한 자태를 뽐내었고, 팔짱끼고 걷던 연인들이 구세군냄비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수줍게 지갑을 열던 따뜻한 그림 같은 장면들이 떠오른다.
지나온 해가 화톳불에 구워진 군밤처럼 트리에 매달려 타닥타닥 붉게 깜박이던 밤들이며 눈이 푹푹 내린 다음날이면 가파른 언덕길에 뿌려져 있던 연탄재도 따뜻함이요, 세밑이면 방구들 속에서 언 손을 재게 뒤집으며 코를 훔치는 아이들의 얼굴도 따뜻함이다.
시끌한 옆집 소리가 제야의 종소리를 타고 넘어와 우리 식구들 웃음에 녹아드는 정경도 겨울이라는 시간이 품어 온 따뜻함이었다.
얼마 전, 남편이 빵을 사왔다. 요즘 겨울빵으로 유행이라는 ‘슈톨렌’이나 ‘뷔세 데 노엘’이 아닌 케이크도 아닌, 새까만 빵을 떡 하니 꺼낸다.
까만 몸에 위는 딸기잼으로 불붙어 빨갛고 속은 타고 남은 재처럼 연노랑 치즈크림이 폭신폭신 들어 간 이름 하여 연탄빵!.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다. 아들이 “엄마! 엄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적 있었어?” 어디에서 들었는지 시구를 들이밀어 함께 웃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성탄아침에 눈을 뜨면 내 머리 맡에만 보름달 빵과 딸기우유가 놓여 있었다. 엄마는 욕심 많고 철없는 딸을 혼 낸 적 없다. 오히려 없는 집에 태어나 어렵게 자라게 한 것을 평생 미안해 하셨다. 해가 바뀌어도 답답함과 늦은 후회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겨울이 추억을 불러 모아 한 해를 따뜻이 넘기어 줬다.
해를 여는 일도 겨울의 일이다. 위기는 예고 없이 준비한 것 보다 더 혹독하게 찾아온다지만 북풍한설이라는 이번 겨울처럼 뼈끝까지 저리게 다가 온 적이 없다.
새해라야 바뀌는 거라고는 년도의 끝자리를 빼고는 찾기 힘든 하수상한 시절, 불편한 휴지기과 일시정지가 강요된 습관이 되어버린 일상 속에서, 가려다 멈추고 멈춘 것을 달래어 다시 가기를 반복하는 것이 점점 더 지치고 힘에 부친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땅 밑 뿌리들이 서로의 손발을 부비며 따뜻함을 끌어올릴 채비를 하고 있을 것이기에 함께 살아 온 것이 다행임을 겨울에게서 배운다.
불필요한 것들을 떨구어 낸 나뭇가지들이 맨몸으로 추위에 맞서왔고 온몸으로 눈을 받아내고 오늘도 봄눈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기에 지금 함께 견디고 있다는 것이 참 고마운 일임을 겨울에게서 또 배우게 된다.
평소엔 멀거나 높아 보이지 않았던 지물들도 눈이 쌓이고 햇볕을 받으면 반짝거렸던 것처럼, 하얀 눈이 온 세상을 같은 높이로 조용히 덮었듯이 열심히 살아온 매일과 부지런한 움직임들이 머지않아 공평하여 예쁜 꽃과 열매가 될 것을 믿으며, 겨울이라는 시간이 춥고 길었던 이유가 우리에게 더 따뜻한 입김과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오늘, 새 봄이라는 이름에 걸 맞는 새롭고도 이로운 일을 만들어 보고자 노트를 꺼내고 할 일을 적는다.
■소요 이영화(48)시인은 현재 용진읍에 거주하고 있으며, 문화고을 자문위원 및 이사, 신문예 자문위원, 아태문인협회 윤리위원, 한국신문예 상임이사, 완주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저작권자 완주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