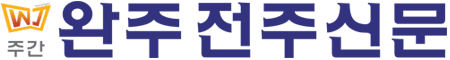more
 홈
오피니언
홈
오피니언
대문 밖 너른 마당(353회-통합 758회) : 돌아다니는 버릇(1)
admin 기자
입력 2022.02.11 09:35
수정 2022.02.11 09:35
돌아다니는 버릇(1)
 | |
| ↑↑ 이승철=칼럼니스트 | |
| ⓒ 완주전주신문 |
△운동구점에 갔습니다. 공 여러 가지더군요. 배구공이 하는 말 “난 공중에 떴다하면 양편에서 주먹으로 처 넘겨 죽을 지경입니다”. 얘기를 듣고 있던 축구공이 “팔자 좋은 소리 다 하네. 넌 손으로나 맞지만 나는 발로 차인다. 너 한번 차볼까?”
야구공이 빙그레 웃으며 “니들은 손이나 발로 당하지만 난 늘 몽둥이를 맞는다.”, 그 곁의 당구공이 “난 뾰쪽한 작대기 끝으로 찍혀 구멍 속에 갇혀버리는데….”, 탁구공·정구공은 차마 말 한마디 할 수 없어 입을 다물었지요. 쇠채로 맞는 골프공은 눈물만 뚬벙뚬벙 떨어뜨렸습니다.
△어시장에 갔습니다. 농가의 키만 한 홍어가 하는 말 “난 잡혀온 지 오래이다. 팔려 가면 이리저리 조각내어 삭혀 먹는데 이 기간이 지루하단다.”, 곁에 있던 새우가 “성님은 크기나 다 했지만 제 키·몸을 보세요. 촘촘한 그물 처 잡아 소금에 버무려 토굴에 가둡니다. 얼마나 쓰리고 추운지 아시나요?”
명태가 나섭니다. “난 동해를 피해 북쪽 바다에서 지내는데 여기까지 쫓아와 그물을 칩니다. 걸리면 그길로 얼려 동태(凍太)라 부르고, 강원도에 실려 오면 산꼭대기 덕장에 모십니다(?). 몸 좀 풀어주려나 했더니만 코를 꿰어 매다는데 그 추위 차라리 냉동고 시절이 났지요. 찬바람에 빼빼 마르면 황태라 부릅니다.”, “삼례-고산-봉동장에 실려 오면 이집 저집으로 팔려가 방망이로 두들겨 맞습니다.”
△곡물 상회에 갔습니다. 나락(벼, 쌀)은 껍질 벗겨지는 이야기, 보리는 몸이 깎이는 얘기, 깨는 불에 볶아 압축기에 넣어 기름 짜는 고통을 말합니다.
△모래내 시장에 들어서자 고개 푹 숙이는 여인이 있어 자세히 보니 열무를 팔러 나오신 당숙모입니다. 숙모는 40대에 혼자되어 4남매를 잘 가르쳤습니다. 며느리가 사무관, 사위는 사장, 식구마다 ‘일 좀 줄이시지요.’ 합니다. 그러나 ‘먹을 건 나눠 먹어야지!’ 하며 노점을 지킵니다. 저는 유명마트에서 콘 하나를 사 드렸습니다.
당숙모는 “나 피로해 가야겠어. 푸른 비닐봉지에 열무를 차곡차곡 담으시더니 ‘이것 조카며느리 갖다 줘’ 이 말을 남기고 시내버스에 얼른 오르셨습니다. 아내는 진짜 열무라며 김치를 담갔고, 폭 익어 맛이 들 무렵 ‘당숙모 작고하셨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저희 내외는 당장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마당에 들어서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저도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모래내시장에서 만 원짜리 한 장 못 빼드린 게 가슴을 칩니다.
당숙모는 위의 공·해물·곡물처럼 사셨습니다. 여인 홀로 40년-생애 80년 재종들은 눈이 뚱뚱 부었습니다. 3일 되던 날 영구차는 조객들의 인사를 받으며 장례식장을 빠져나갑니다. 화장(?)·매장(?) 어느 쪽일까요.
우리 쉬면서 삽시다. ‘서로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며, 색깔이 아름다우면 친구가 됩니다.’
/ 이승철 = 칼럼니스트,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저작권자 완주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