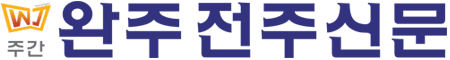more
 홈
오피니언
홈
오피니언
대문 밖 너른 마당(352회-통합 757회) : 여보! 대한(大寒) 추위에 발 시리지?
admin 기자
입력 2022.01.28 09:31
수정 2022.01.28 09:31
여보! 대한(大寒) 추위에 발 시리지?
 | |
| ↑↑ 이승철 = 칼럼니스트 | |
| ⓒ 완주전주신문 |
A씨는 결국 정이 들어 살림을 차렸고 애까지 낳았다. 이를 안 본부인(B)은 평생 이 둘을 상대하지 않았고, 혹 남편 안부를 물어도 불쾌하게 여겼다. 성미를 아는 A씨는 본부인 곁에 얼씬거리지 않았으며 각각 살다 고인이 될 나이에 들었다.
본부인이 죽어 수의(壽衣) 보따리를 펼치니 남녀용 두 벌이 있고, 쪽지에 “마지막 내 얼굴은 현숙 아빠가 덮어 주오. 패물 3분의 1은 ‘그가 무슨 죄’요. 현숙이 주시오” 상주 상제 방바닥을 치며 울었다. B씨(본처) 몸에서 난 형제는 100 일을 넘기지 않고 길 가에 사모비(思母碑)를 세웠다.
대한 날 비석 앞에서 신기함을 보고 놀랐다. 어디선가 버드나무 잎이 밀려와 비석 받침돌을 두툼하게 덮었다.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다 함박눈으로 바뀌어 버들잎 위에 눈이 쌓인다.
“여보. 발 시리지!” 이런 환청(幻聽)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만 가야지” 친구가 어깨를 툭툭 친다. 이게 사람들의 인연이다. 사생활이기에 더 이상 설명은 줄인다. 소실(小室) 첩(妾) 소리를 들으며 산 현숙 엄마도 가련한 여인이었다.
▲제2화: 상호 업종을 대면 다 아는 여인으로 인품과 행동이 훌륭했으나 혼인한지 3년이 되도록 태기가 없어 산부인과에 가니 수태 어렵다고 한다. 그 충격 땅이 꺼지는 듯했다.
여러 날 실의에 빠졌던 여인은 남편에게 “우리 집안을 위하여 새 장가를 드시오.”, “당신이 내 말대로 하면 금녕 김씨 번창하고, 내 의견 따르지 않으면 우리 노후 추해집니다.”
그날부터 팔을 걷어 부치고 외동서를 고른다. 마침 심덕 고운 처녀를 알아냈다. 당장 논 닷 마지기를 사주고 남편 새 장가를 들였다. 혼인 이후 자기는 온 종일 가게 일을 보며 살림은 동서에게 맡겼다.
외동서 10년 안에 4 형제를 낳자 큰 부인은 그때그때 자기 앞으로 출생 신고를 마쳤으며, 큰어머니가 잘 길렀다. 집안 티 없이 조용하니 본처의 선견지명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큰 부인이 가셨다. 상여 뒤에 아들 며느리 도합 여덟 명과 손자, 조카, 친정 식구, 집안 일가, 마을 사람, 종교 단체원 등 300여명이 뒤를 따랐다.
상주와 상제는 닭똥만한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렸다. 동서는 땅을 구르며 통곡한다. 공포와 만사 그리고 상여 포가 바람결에 하늘 높이 떠올라 휘날린다. 지금 그 4형제의 재산을 모두 합하면 고산 사람 중 최고이다.
되는 가정은 다르다. 여남이 화합하면 집안이 번창 한다.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물어야 하고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 정이 든다.
/ 이승철 = 칼럼니스트,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저작권자 완주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