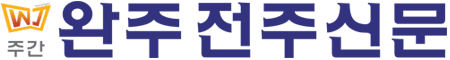more
 홈
오피니언
홈
오피니언
대문 밖 너른 마당(179회-통합 584회) 무엇 얻어먹으러 가
admin 기자
입력 2018.04.06 08:52
수정 2018.04.06 08:52
무엇 얻어먹으러 가
 | |
| ↑↑ 이승철=칼럼니스트 | |
| ⓒ 완주전주신문 |
‘어쩌고 어째?’ 이 소리가 금방 나오려는데 꾹 참고 보니 아내 표현에 일리가 있다.
1948년 5·10 최초 선거 때부터 어느 기간까지는 유세장에서 식권 한 장 얻을 수 있었고 이런 경우 재수 좋은 날이었다. 마을 회갑잔치 마당이나 초상집에 가면 얻어먹을 게 있었다.
놉 얻어 일하는 집에 들르면 새참 나눠줬고, 정초 에 외가 고모댁 세배가면 밥상이 나왔으며, 친구 하숙집 찾아가 밥 얻어먹던 시대도 있었다.
거지는 식전마다 ‘밥 이르고 갑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마을 한 바퀴 돌다 ‘다시 왔습니다. 밥 좀 주시오’ 이 소리에 주인이 들고 나가면 땅 바닥에 앉아 먹거나 바가지에 받아 가는데 이는 식구와 함께 먹으려함이다.
잔치 집에 걸인 모여들었다. 혹 눈치 없이 괄시하면 그냥 버티고 앉아있어 골칫거리… 이때 재치 빠른 주인일수록 얼른 대장(?)을 만나 귀에 속삭이고 한 상 푸짐하게 차려내면 둘러앉아 맛있게 먹고 나서 스르르 물러갔다.
가난도 여러 가지. 자취생 양식 떨어지면 아는 집 찾아가 한 끼 때움도 잠재적 걸식이 아닌가. 혈육 고모님의 인정이 후했다. 조카 한 술이라도 더 먹이려고 본인 밥 푹 퍼 조카 그릇에 얹어주셨다. 그 고모님 가셨고 내사촌도 또한 갔으며, 조카는 만날 기회가 없어 친척끼리 멀어진 세상이다.
살림 나아져 허기진 사람이 없자 ‘무엇 얻어먹으러 가!’ 이 말도 사라졌고, 식권 생각하는 선거판이나 잘 먹으려 명절 기다리는 애들이 없으며, 겸사겸사 밥 한 끼의 세배도 자취를 감췄다.
달라는 사람이 줄고, 줄 사람 없으니 남은 음식 쓰레기로 나간다. 쇠고기 질기다 타박하며, 뱃살빼기 걱정하니 복이 넘쳐 먹을 걸 줘도 고마운 줄을 모른다.
ㄱ씨가 교회에 쌀 240kg를 냈는데 고맙다며 감사기도 하는 목사·장로가 없단다. 세 가마만 있으면 아들 딸 여웠던 80대 이상만이 놀란다.
어려운 살림에 혼인시켜도 5∼6인 자녀 낳아 고등학교·대학에 보냈고 손님 대접 여일했다. 이게 한국인의 본 바랑 인정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나는 정, 드는 정’ 이 애정들이 모두 음식에서 출발했으며 우리 조상의 매력이었다.
‘진지 잡수셨어요?’ 이게 인사이었다. 밥상머리에서 똑똑뚝 휴대폰을 주무르는 사람일수록 식사 고마운 줄을 모른다.
‘무엇 얻어먹으러 가!’ 이 말이 사라져서 다행이고, 이 말 안 써 천행이다. 무심코 던진 아내의 ‘무엇 얻어먹으러가’ 이 한마디가 결국 나를 빙그레 웃겼다.
남권희 고산주민자치회장 『고산면지』를 만들며 점심 걱정 잘 하고, 대광반점 노재기 장로가 반기며 군만두로 요기(療飢) 시킨다.
/이승철(국사편찬위원회/사료조사위원) 칼럼니스트(esc2691@naver.com)
저작권자 완주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