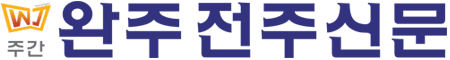more
 홈
오피니언
홈
오피니언
대문 밖 너른 마당(175회-통합 580회) 통곡하는 상제(喪制)
admin 기자
입력 2018.03.09 09:35
수정 2018.03.09 09:35
통곡하는 상제(喪制)
 | |
| ↑↑ 이승철=칼럼니스트 | |
| ⓒ 완주전주신문 |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족히 100여개의 꽃 사다리마다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한결같다.
신발 놓을 자리가 없다. 영정 앞에 서니 사진 속 친구가 ‘어서 오게나’ 하는듯한 표정이기에 팔을 펴 어루만지려하나 닿지 않는다.
흔히 눈감고 묵념하는데 사진에서 눈을 뗄 수 없고 눈물이 핑 돈다. 꽃 속에 끼어있는 글씨 한 장이 흐릿한 눈 속에 들어오자마자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장팔덕(張八德)!’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불러진다. 뜨거운 눈물이 턱 끝까지 흘러내릴 때 부축하는 젊은이의 손에 이끌려 일어나 상주에게 문상하고 물러나는데 인도하는 자가 있다.
구석에 앉으니 상을 차리려한다. 사양하니 ‘누굴 기다리느냐?’고 묻는다. 그 말 맞다. 문상 혼자가면 미움 받는다. 4인상을 독차지하기 때문이다.
영정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나 거리는 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 가려 초점을 잃고 있을 때 소복한 할머니가 젊은이의 부축을 받으며 상 앞에 선다. 일어서서 인사하고 앉으니 친구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연말에 보내주신 친필 연하장 받으시고 무척 기뻐 읽고 또 어루만지며 좋아하시더니만 가셨습니다.”
가슴이 뭉클하다. 장팔덕 이 친구 아들-딸-손자-조카 이야기를 평생 하지 않았지만 △큰아들은 기업가 △딸은 문인 △손자는 법조인 △동생은 목사 △조카는 외교관… 하나하나 물어서 알았기에 그때마다 축하장을 빼놓지 않고 보낸 걸 친구 부인이 알고 있다.
부인은 전주여고를 나온 문학 애호인으로 자기가 보낸 편지를 평생 함께 보았다는 게다. 이리하여 연하장을 영정 곁에 모셨다는 설명이다. 고마운 줄 알면서도 남녀유별이라 오늘 처음 드리는 말씀이란다.
눈물이 벌컥 솟아올라 더 이상 있어선 아니 되겠기에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부인 앞에 놓으니 의아해 한다.
“이게 친구 시계입니다. 큰 아들 취직되고 받은 첫 선물입니다.”, “우리 둘은 6·25전쟁이 막 끝나고 성동구 금호동 산꼭대기에서 자취생활을 할 때, 제가 좀 성질이 급한 편이라서 친구에게 늘 ‘몇 시냐?’고 물어댔지요. 당시 친구는 낡은 손목시계가 있었습니다. 하루 두 번 맞을 때가 많았지요.”, “바로 이 시절을 잊지 않았던 친구는 아들한테 받은 시계를 제게 주었고, 전 감이 차고 다닐 수 없어 평생 부자를 생각하며 간직해 왔으나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 돌려드리려고 오늘 여길 찾아왔습니다.”
부인은 처음 듣는 말이라 감동이 너무 커 영감 손을 덥석 잡고서 놓지를 못한 채 하얀 치마폭에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린다. 주변이 조용하다. 검정 상복 입은 남녀 여러 상제들이 쭉 둘러앉아 흐느낀다. 큰 아들이 통곡한다.
울음소리가 있는 상가(喪家) 이야기이다. 장례식장을 떠나며 마음속으로 ‘장덕팔! 날 좀 데려가소.’
/이승철(국사편찬위원회/사료조사위원) 칼럼니스트(esc2691@naver.com)
저작권자 완주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