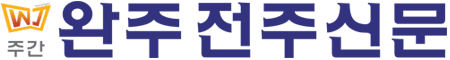more
 홈
오피니언
홈
오피니언
대문 밖 너른 마당(171회-통합 576회) 보물(寶物)?
admin 기자
입력 2018.02.02 09:15
수정 2018.02.02 09:15
보물(寶物)?
 | |
| ↑↑ 이승철=칼럼니스트 | |
| ⓒ 완주전주신문 |
종류도 많겠지만 여기선 책 한 권 『문청공가사(文淸公歌詞)』를 소개한다.
△노래책이다. △한글로 썼으며 표지 포함 35장 △순서와 작품으로 ▲관동별곡(關東別曲) ▲사미인곡(思美人曲) ▲속미인곡(續美人曲) ▲성산별곡(星山別曲) ▲단가(短歌) 16수 ▲경민가(警民歌) ▲주문답병하(酒問答幷下) 3수 ▲부성은가(附聖恩歌) ▲속전지연가(俗傳紙鳶歌) ▲서하당벽오가(捿霞堂碧梧歌)가 있고 △뒤에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서포(西浦) 김만중(金萬重) 선생의 <관동별곡> 한문 번사(飜辭) 외에 △배와(坯窩) 김상숙(金相肅)의 번(飜)사미인곡·속미인곡, 서문(序文)·발문(跋文) △잠수(潛叟) 기정진(奇正鎭) 번사성산별곡(飜辭星山別曲) △북헌(北軒) 김춘택(金春澤) 번장진주사(飜將進酒辭) △석은(石隱) 송달수(宋達洙) 번주문답(飜酒問答) △한익모(韓翼謨)의 번운 단가십육수(飜云 短歌十六首)로 꾸며졌다.
△책과 관련된 인명에 ▲9세손 ▲현손 천(洊) ▲6세손 도(棹) ▲오대손 관하(觀河) ▲후손 감사(監事) 실(實), 방(枋), 민하(敏河), 유금(流金), 해기(海琦) ▲김수항(金壽恒) ▲이선(李選) ▲석은(石隱) 송달수(宋達洙) ▲우재(迂齋) 이후원(李厚源) ▲산수(山水) 권진응(權震應) ▲명고(鳴皐) 임전(任錪) ▲권필(權鞸) ▲판서(判書) 신석우(申錫愚)가 나오며 △책 가운데 부안군 산내면 마포리(扶安郡山內面馬浦里)·부안군 출포면(扶安郡茁浦面) 낙서(洛書)도 있다.
△필사본(筆寫本) 책 글씨는 송강(松江) 정철 9세손 아무개(氵+奎)가 정축 원월 상한(丁丑元月上澣)에 썼다. 알다시피 정철(1536~1593) 작품으로 학계에서 수없이 연구 발표를 했기에 여기선 줄인다.
가치로 보아 우리 전북에서 빠져나가선 아니 될 책이다.
혹여 다른 도로 나가면 부안, 전주, 전라북도의 문화 손실로 보인다.
붓으로 쓴 단 한 권 『문청공가사』글도 좋지만 서책 자체가 ‘보물’ 아닐지?
석주(石洲) 권필(權鞸:1569∼1612)은 정철 묘 앞을 그냥 지나지 못하고 “허공 나무들 비에 잎 져 쓸쓸한데/ 상국 풍류는 왜 이리 적막한가/ 슬프고도 슬프도다 한 잔 술 부어 올리나니/ 옛 노래 곡조야 이 아침 일 같구려”(한시 원문 생략)
옛 어른들은 이렇거늘 우린 술 부어 절은 못할망정 혹여 젊은 학자나 교수들조차 귀중한 책자를 외면한다면 우리 역사 문화·문학은 어디로 간단 말이냐.
“내 마음 베혀내어 저 달을 맹글고져/ 구만리 쟝텬의 반듯이 걸려 잇어/ 고은님 계신 고대 가 비쳐나 보리다”
책 보관 상태가 좋고 누군가 정성껏 보면서 붉은 물감으로 방점을 찍어 두아 고어(古語) 방언(方言) 보기가 한결 수월하다. 한자 마다 한글 표기까지 해 두었다. 확실히 ‘보배’로운 책이다.
/이승철(국사편찬위원회/사료조사위원) 칼럼니스트(esc2691@naver.com)
저작권자 완주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