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초가을 등산 등 야외활동 시 식용버섯과 유사한 독버섯 유의해야
전라북도는 레저활동이나 등산을 하면서 산에서 쉽게 만나게 되는 각종 야생버섯 가운데 독버섯이 많이 있으므로 잘못된 버섯상식으로 함부로 먹으면 위험하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 5일근무제의 정착으로 야외 레저활동, 산행 인구가 많아지고 잦은 강우로 산림내 습도가 높아 버섯 발생량이 많아 질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버섯 식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는 송이, 능이, 꾀꼬리버섯, 까치버섯, 싸리버섯, 뽕나무버섯, 느타리, 노루궁뎅이 등 식용버섯으로 잘 알려있지만 이와 유사한 독버섯이 많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자생하는 야생버섯은 1,600여 종으로, 이 중 식용 가능한 버섯은 350여 종이고 독버섯은 90여 종에 이르며, 나머지는 식용버섯인지 독버섯인지 불명확하다.
특히, 개나리광대버섯, 독우산광대버섯, 흰알광대버섯 등은 소량만 섭취해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맹독성 버섯으로 알려진 종류들도 식용버섯이 발생하는 시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독버섯 중독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야생버섯을 식용할 때는 반드시 알고 있는 버섯만 먹는 것이 중요하다.
식용버섯과 독버섯은 모양이 유사한 것이 많고, 일반인이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 실제로 2010년에는 경북 안동에서 개나리광대버섯을 식용버섯인 노란달걀버섯으로 잘못 알고 요리해 먹은 마을주민 2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야생버섯을 먹은 후 메스껍고, 구역질이 나고, 구토, 설사,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먹은 음식물을 토해내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원에 갈 때에는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중독환자나 보호자는 먹었던 버섯을 꼭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버섯 종류에 따라 독소물질이 다르고 치료법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식용버섯과 유사한 독버섯의 구분법을 알아두는 것도 좋다. 식용버섯인 느타리와 독버섯인 화경버섯, 곰보버섯과 마귀곰보버섯, 싸리버섯과 노랑싸리버섯, 송이와 담갈색송이 등은 모양이 비슷하지만 자세히 살펴보거나 쪼개보면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유념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독버섯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버섯은 화려하고, 민달팽이나 곤충 피해가 없고, 은수저를 검게 변화시키며, 대가 세로로 찢어지고, 소금물에 절이면 무독화 된다는 말들은 잘못된 상식의 대표적인 예이다.
민달팽이나 곤충은 사람보다 버섯 독소에 저항성이 크기 때문에 벌레 먹은 독버섯도 많이 있다. 약한 독소를 가진 독버섯들은 소금물로 독소물질을 우려 낼 수 있지만, 맹독성 버섯은 독소물질이 소량으로도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소금물에 절인다고 독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끓여도 독성이 파괴되지 않아 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톡신, 팔로톡신과 같은 독소는 250~280℃에서 녹으며 이런 독소들은 0.1~0.5mg/kg 함양만으로도 50%의 치사율이 나타난다.
전라북도 산림당국은 “매년 초가을 버섯 중독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알고 있는 버섯만 식용해 줄것과 중독 증상이 있을 경우 민간요법을 사용하기보다는 가까운 병원에 가서 빠른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5일근무제의 정착으로 야외 레저활동, 산행 인구가 많아지고 잦은 강우로 산림내 습도가 높아 버섯 발생량이 많아 질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버섯 식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는 송이, 능이, 꾀꼬리버섯, 까치버섯, 싸리버섯, 뽕나무버섯, 느타리, 노루궁뎅이 등 식용버섯으로 잘 알려있지만 이와 유사한 독버섯이 많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자생하는 야생버섯은 1,600여 종으로, 이 중 식용 가능한 버섯은 350여 종이고 독버섯은 90여 종에 이르며, 나머지는 식용버섯인지 독버섯인지 불명확하다.
특히, 개나리광대버섯, 독우산광대버섯, 흰알광대버섯 등은 소량만 섭취해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맹독성 버섯으로 알려진 종류들도 식용버섯이 발생하는 시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독버섯 중독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야생버섯을 식용할 때는 반드시 알고 있는 버섯만 먹는 것이 중요하다.
식용버섯과 독버섯은 모양이 유사한 것이 많고, 일반인이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 실제로 2010년에는 경북 안동에서 개나리광대버섯을 식용버섯인 노란달걀버섯으로 잘못 알고 요리해 먹은 마을주민 2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야생버섯을 먹은 후 메스껍고, 구역질이 나고, 구토, 설사,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먹은 음식물을 토해내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원에 갈 때에는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중독환자나 보호자는 먹었던 버섯을 꼭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버섯 종류에 따라 독소물질이 다르고 치료법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식용버섯과 유사한 독버섯의 구분법을 알아두는 것도 좋다. 식용버섯인 느타리와 독버섯인 화경버섯, 곰보버섯과 마귀곰보버섯, 싸리버섯과 노랑싸리버섯, 송이와 담갈색송이 등은 모양이 비슷하지만 자세히 살펴보거나 쪼개보면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유념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독버섯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버섯은 화려하고, 민달팽이나 곤충 피해가 없고, 은수저를 검게 변화시키며, 대가 세로로 찢어지고, 소금물에 절이면 무독화 된다는 말들은 잘못된 상식의 대표적인 예이다.
민달팽이나 곤충은 사람보다 버섯 독소에 저항성이 크기 때문에 벌레 먹은 독버섯도 많이 있다. 약한 독소를 가진 독버섯들은 소금물로 독소물질을 우려 낼 수 있지만, 맹독성 버섯은 독소물질이 소량으로도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소금물에 절인다고 독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끓여도 독성이 파괴되지 않아 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톡신, 팔로톡신과 같은 독소는 250~280℃에서 녹으며 이런 독소들은 0.1~0.5mg/kg 함양만으로도 50%의 치사율이 나타난다.
전라북도 산림당국은 “매년 초가을 버섯 중독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알고 있는 버섯만 식용해 줄것과 중독 증상이 있을 경우 민간요법을 사용하기보다는 가까운 병원에 가서 빠른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완주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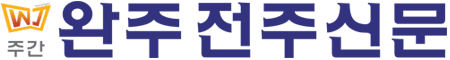



 홈
전북소식
홈
전북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