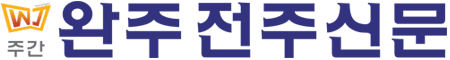more
 홈
특집/기획
홈
특집/기획
동학농민혁명 역사광장·호산서원 등 볼거리 풍성
임태호 기자
입력 2012.08.31 13:43
수정 2012.08.31 01:43
완산 8경의 하나인 ‘비비정’과 인근의 신문화조성사업이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이색적인 공간
삼례읍은 완주군에서 가장 먼저 읍으로 승격된 지역으로 본래 전주군 지역이었다. 1935년 10월 1일 이후로는 완주군 오백저면으로 수계, 청계, 신포, 덕천, 신덕, 가인, 서신, 대천 등 44개 동리를 관할했는데 고종32년(1895)에 창덕면으로 고쳤다.
1914년에는 군·면 폐합에 따라 우서면의 후상, 해전, 신사, 신평, 어전, 신왕, 쌍남, 쌍북, 중신, 신평의 10개 동리와 우동면의 서당리 일부와 봉상면의 명덕리 일부와 익산국 춘포면의 장연, 문종의 각 일부와 같은 군 우북면의 화산리 일부와 같은 군 두촌면의 학연리 일부를 병합해 옛 삼례역의 이름을 따서 삼례면이라 하여 수계, 신탁, 석전, 신금, 구와, 삼례, 후정, 해전, 어전의 9개 리로 개편 관할하다가 1956년 7월8일 법률 제 395호에 의해 읍으로 승격되고, 1973년 7월1일 대통령령 제 654호에 의하여 익산국 왕궁면의 온수리 일부를 편입하여 삼례, 후정, 어전, 해전, 시금, 석전, 구와, 신탁, 수계, 하리 등 10개리가 되었다.
이곳 삼례읍에는 완산 8경 중의 하나인 비비정이 위치해 있으며, 인근의 비비정 마을은 신문화조성사업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아울러 역사적으로는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로 그 위상을 높이고 있기도 하다. 가을의 문턱에서 가족과 함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삼례읍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 비비정
비비정은 삼례읍 후정리에 위치해 있는데, 그 아름다움은 완산 8경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비비정 인근에는 비비정 마을이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을 통해 마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자원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다.
이 마을에는 근대문화유산 제221호로 지정된 삼례양수장을 이용해 다목정 공간과 농가레스토랑, 생태·역사산책로 등의 사업을 통해 변모하고 있다.
완산 8경에서는 비비정을 ‘비비낙안(飛飛落雁) - 한내천 백사장에 내려앉은 기러기 떼를 비비정에서 바라본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정자 앞을 흐르는 한내천은 삼천과 추천, 전주천이 합수되어 다시 거듭 소양천과 고산천에 합수되어 만경강을 일으키는 곳이다.
한내란 호남으로 빠지는 관로의 요충이란 큰 내라는 뜻과 완주군 내 깊은 산중에서 물이 내려와 만들어진 소양천과 고산천이 합류되어 물이 유난히 차서 한(寒)내라는 뜻도 있다.
이곳 한내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한 마지막 길목이었고, 동학농민군이 서울로 진격한 월천이기도 하다.
비비정 앞을 흐르는 한내의 오랜 세월 말없이 유유히 흐르며 민족의 애환을 지켜본 셈이다.
비비정은 1537년(선조 6년)에 무인 최영길(崔永吉)이 별장으로 지은 것인데 중간에 철거된 것을 1752년(영조 28년)에 관찰사 서명구(徐命九)가 중건해 관정(官亭)으로 삼았다.
그러나 오랜 세월에 관리가 부실해지면서 소실되자 최영길의 9대손인 최광용이 을유년에 감영에 품계를 했지만 중건을 보지 못했다.
우암 송시열이 지은 ‘비비정기(飛飛亭記)’를 보면 우암이 최씨 집안을 찬양하기 위해 ‘장비(張飛)’나 ‘악비(岳飛)’ 등 중국 명장의 이름을 붙여 비비정이라고 했을 뿐 지명을 취한 것은 아니다.
‘비비정기’는 최영길의 손자인 최양(崔良)의 청탁을 받고 쓴 것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최양이 찾아와서 나에게 정자의 기문을 청탁한다. 그의 조부 최영길은 창주첨사(昌州僉使 - 문관 종4품)를 지냈는데 정자는 선조 6년(1537년)창건했다는 것으로 그의 부친 최완성도 나난만호(羅暖萬戶 - 무관 종4품)를 지냈으며, 최양 또한 조업을 이어 문관이었다.
당시 무관들은 추세속으로 권문에 아첨하여 뇌물이나 바치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들은 청고한 인물이어서 정자를 일으키어 풍아하게 살았고, 최양은 살림이 넉넉하지 못한데도 정자를 보수한 것은 효성에서 우러난 일이라 하겠다.
비비정이라 이름 한 뜻을 물으니 지명에서 연유된 것이라고는 하나 내가(송시열)이 생각하기에는 그대의 가문이 무변일진대 옛날에 장익덕은 신의와 용맹스러운 사람이었고, 악무목은 충과 효로 알려진 사람이었으니 둘이 다 함께 이름이 비자였다.
비록 세월은 오래 되었다 할지라도 무인의 귀감이 아니겠는가. 장비와 악비의 충절을 본뜬다면 정자의 규모는 비록 작다 할지라도 뜻은 큰 것이 아니겠는가.”
■동학농민혁명 역사광장
동학농민혁명 역사광장은 삼례읍 신금리 산70-2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의 의의를 기리기 위해 부지면적 5천333㎡의 넓이로 대동의 장, 선양의 장, 추념의 장 등 3점의 상징물이 조성되어 있다.
특히 삼례봉기는 동학농민혁명이 반외세와 반침략 운동으로 전환된 계기를 마련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전문가들도 삼례는 동학농민혁명 전체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다.
그도 그럴 것이 동학농민혁명 1차봉기가 부패한 관리와 부호에 대한 반봉건적 투쟁이었다면 삼례에서 열린 2차봉기는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인 반일구국항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역사광장 내 3개의 상징물들을 살펴보면 ‘추념의 장’은 농기구를 형상화한 청동 주조로 만들어 졌으며, ‘대동의 장’은 “누리 널리 하나되어” 라는 주제로 마천석으로 만들어졌다.
이밖에 ‘선양의 장’과 공원 내에는 동학농민혁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설명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산서원
호산서원은 비비정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또한 인근의 대명아파트에는 삼례의 수도산공원이 완공되어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다.
호산서원은 언제 누구에 의해 이곳에 처음 세워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다.
다만 고종(高宗) 5년인 1868년에 대원군의 전국 서원 철폐령에 의해 철거되었던 것을 일제강점기 때 이 곳 유림들에 의해 복원되었고, 한국전쟁으로 서원안에 있던 산앙재와 강당이 불에 타 없어졌다고 한다.
그 뒤 1958년 이 지방의 유지인 한증수(韓曾洙)와 유림들의 노력에 의해 산앙재와 강당이 복원돼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으로 되어있고 주변의 부속 건물로는 삼문, 교직사 등이 있다.
현재 이 서원에는 고려 충신인 정몽주(鄭夢周)를 주벽(主壁)으로 송시열(宋時烈) 김수항(金壽恒) 김동준(金東準) 정숙주(鄭叔周)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정몽주의 호는 포은(圃隱)이었으며, 고려시대 충숙왕 6년인 1337년에 영천에서 정운관의 아들로 태어나 공양왕 4년인 1392년 선죽교에서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 의해 타살 되었다고 한다.
그는 벽상삼한삼중대광 수문하시중 판도평사 사병조상서시사 영경영전사 우문관 대제학을 역임했다. 그의 시 가운데 단심가(丹心歌)는 한시의 일품으로 현재까지 유명하다.
송시열의 호는 우암(尤庵)이였으며, 김장생과 김집에게 성리학을 배웠고, 숙종 15년인 1689년에 왕세자 책봉의 시기가 맞지 않다는 상소를 올리고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그의 저서로는 송자대전(宋子大全)이 전하고 있다.
김수항은 인조 7년인 1629년에 태어나 숙종 15년인 1689년에 죽었으며, 호는 문곡(文谷)이다.
그는 항상 송시열과 함께 행동했으며, 숙중 7년인 1681년에 현종실록(顯宗實錄)을 편찬할 때 최고 책임자인 총재관을 역임했고, 전서체(篆書體)의 글씨를 잘 썼다고 한다.
그는 병자호란 후 청나라와 화친이 맺어지자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인 완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에 전념했다고 한다.
정숙주의 호는 학포(學圃)였으며, 인조 18년인 1640년에 생원과 진사에 모두 합격했으며,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삼례역에서 의병을 모아 청나라와 싸웠다고 한다.
1914년에는 군·면 폐합에 따라 우서면의 후상, 해전, 신사, 신평, 어전, 신왕, 쌍남, 쌍북, 중신, 신평의 10개 동리와 우동면의 서당리 일부와 봉상면의 명덕리 일부와 익산국 춘포면의 장연, 문종의 각 일부와 같은 군 우북면의 화산리 일부와 같은 군 두촌면의 학연리 일부를 병합해 옛 삼례역의 이름을 따서 삼례면이라 하여 수계, 신탁, 석전, 신금, 구와, 삼례, 후정, 해전, 어전의 9개 리로 개편 관할하다가 1956년 7월8일 법률 제 395호에 의해 읍으로 승격되고, 1973년 7월1일 대통령령 제 654호에 의하여 익산국 왕궁면의 온수리 일부를 편입하여 삼례, 후정, 어전, 해전, 시금, 석전, 구와, 신탁, 수계, 하리 등 10개리가 되었다.
이곳 삼례읍에는 완산 8경 중의 하나인 비비정이 위치해 있으며, 인근의 비비정 마을은 신문화조성사업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아울러 역사적으로는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로 그 위상을 높이고 있기도 하다. 가을의 문턱에서 가족과 함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삼례읍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 비비정
비비정은 삼례읍 후정리에 위치해 있는데, 그 아름다움은 완산 8경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비비정 인근에는 비비정 마을이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을 통해 마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자원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다.
이 마을에는 근대문화유산 제221호로 지정된 삼례양수장을 이용해 다목정 공간과 농가레스토랑, 생태·역사산책로 등의 사업을 통해 변모하고 있다.
완산 8경에서는 비비정을 ‘비비낙안(飛飛落雁) - 한내천 백사장에 내려앉은 기러기 떼를 비비정에서 바라본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
| ⓒ 완주군민신문 |
이 정자 앞을 흐르는 한내천은 삼천과 추천, 전주천이 합수되어 다시 거듭 소양천과 고산천에 합수되어 만경강을 일으키는 곳이다.
한내란 호남으로 빠지는 관로의 요충이란 큰 내라는 뜻과 완주군 내 깊은 산중에서 물이 내려와 만들어진 소양천과 고산천이 합류되어 물이 유난히 차서 한(寒)내라는 뜻도 있다.
이곳 한내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한 마지막 길목이었고, 동학농민군이 서울로 진격한 월천이기도 하다.
비비정 앞을 흐르는 한내의 오랜 세월 말없이 유유히 흐르며 민족의 애환을 지켜본 셈이다.
비비정은 1537년(선조 6년)에 무인 최영길(崔永吉)이 별장으로 지은 것인데 중간에 철거된 것을 1752년(영조 28년)에 관찰사 서명구(徐命九)가 중건해 관정(官亭)으로 삼았다.
그러나 오랜 세월에 관리가 부실해지면서 소실되자 최영길의 9대손인 최광용이 을유년에 감영에 품계를 했지만 중건을 보지 못했다.
우암 송시열이 지은 ‘비비정기(飛飛亭記)’를 보면 우암이 최씨 집안을 찬양하기 위해 ‘장비(張飛)’나 ‘악비(岳飛)’ 등 중국 명장의 이름을 붙여 비비정이라고 했을 뿐 지명을 취한 것은 아니다.
‘비비정기’는 최영길의 손자인 최양(崔良)의 청탁을 받고 쓴 것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최양이 찾아와서 나에게 정자의 기문을 청탁한다. 그의 조부 최영길은 창주첨사(昌州僉使 - 문관 종4품)를 지냈는데 정자는 선조 6년(1537년)창건했다는 것으로 그의 부친 최완성도 나난만호(羅暖萬戶 - 무관 종4품)를 지냈으며, 최양 또한 조업을 이어 문관이었다.
당시 무관들은 추세속으로 권문에 아첨하여 뇌물이나 바치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들은 청고한 인물이어서 정자를 일으키어 풍아하게 살았고, 최양은 살림이 넉넉하지 못한데도 정자를 보수한 것은 효성에서 우러난 일이라 하겠다.
비비정이라 이름 한 뜻을 물으니 지명에서 연유된 것이라고는 하나 내가(송시열)이 생각하기에는 그대의 가문이 무변일진대 옛날에 장익덕은 신의와 용맹스러운 사람이었고, 악무목은 충과 효로 알려진 사람이었으니 둘이 다 함께 이름이 비자였다.
비록 세월은 오래 되었다 할지라도 무인의 귀감이 아니겠는가. 장비와 악비의 충절을 본뜬다면 정자의 규모는 비록 작다 할지라도 뜻은 큰 것이 아니겠는가.”
■동학농민혁명 역사광장
동학농민혁명 역사광장은 삼례읍 신금리 산70-2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의 의의를 기리기 위해 부지면적 5천333㎡의 넓이로 대동의 장, 선양의 장, 추념의 장 등 3점의 상징물이 조성되어 있다.
특히 삼례봉기는 동학농민혁명이 반외세와 반침략 운동으로 전환된 계기를 마련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
| ⓒ 완주군민신문 |
동학농민혁명의 전문가들도 삼례는 동학농민혁명 전체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다.
그도 그럴 것이 동학농민혁명 1차봉기가 부패한 관리와 부호에 대한 반봉건적 투쟁이었다면 삼례에서 열린 2차봉기는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인 반일구국항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역사광장 내 3개의 상징물들을 살펴보면 ‘추념의 장’은 농기구를 형상화한 청동 주조로 만들어 졌으며, ‘대동의 장’은 “누리 널리 하나되어” 라는 주제로 마천석으로 만들어졌다.
이밖에 ‘선양의 장’과 공원 내에는 동학농민혁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설명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산서원
호산서원은 비비정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또한 인근의 대명아파트에는 삼례의 수도산공원이 완공되어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다.
호산서원은 언제 누구에 의해 이곳에 처음 세워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다.
다만 고종(高宗) 5년인 1868년에 대원군의 전국 서원 철폐령에 의해 철거되었던 것을 일제강점기 때 이 곳 유림들에 의해 복원되었고, 한국전쟁으로 서원안에 있던 산앙재와 강당이 불에 타 없어졌다고 한다.
 |
| ⓒ 완주군민신문 |
그 뒤 1958년 이 지방의 유지인 한증수(韓曾洙)와 유림들의 노력에 의해 산앙재와 강당이 복원돼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으로 되어있고 주변의 부속 건물로는 삼문, 교직사 등이 있다.
현재 이 서원에는 고려 충신인 정몽주(鄭夢周)를 주벽(主壁)으로 송시열(宋時烈) 김수항(金壽恒) 김동준(金東準) 정숙주(鄭叔周)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정몽주의 호는 포은(圃隱)이었으며, 고려시대 충숙왕 6년인 1337년에 영천에서 정운관의 아들로 태어나 공양왕 4년인 1392년 선죽교에서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 의해 타살 되었다고 한다.
그는 벽상삼한삼중대광 수문하시중 판도평사 사병조상서시사 영경영전사 우문관 대제학을 역임했다. 그의 시 가운데 단심가(丹心歌)는 한시의 일품으로 현재까지 유명하다.
송시열의 호는 우암(尤庵)이였으며, 김장생과 김집에게 성리학을 배웠고, 숙종 15년인 1689년에 왕세자 책봉의 시기가 맞지 않다는 상소를 올리고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그의 저서로는 송자대전(宋子大全)이 전하고 있다.
김수항은 인조 7년인 1629년에 태어나 숙종 15년인 1689년에 죽었으며, 호는 문곡(文谷)이다.
그는 항상 송시열과 함께 행동했으며, 숙중 7년인 1681년에 현종실록(顯宗實錄)을 편찬할 때 최고 책임자인 총재관을 역임했고, 전서체(篆書體)의 글씨를 잘 썼다고 한다.
그는 병자호란 후 청나라와 화친이 맺어지자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인 완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에 전념했다고 한다.
정숙주의 호는 학포(學圃)였으며, 인조 18년인 1640년에 생원과 진사에 모두 합격했으며,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삼례역에서 의병을 모아 청나라와 싸웠다고 한다.
저작권자 완주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