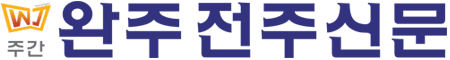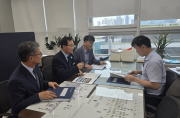more
 홈
특집/기획
홈
특집/기획
어머니의 품 같이 포근함을 자랑하는 호남의 명산 모악산
임태호 기자
입력 2012.11.16 11:15
수정 2012.11.16 11:15
진묵대사의 자취를 찾아 떠나보는 가벼운 겨울 초입의 산행
예술적 가치가 높은 대원사 용각부도와 물맛이 좋은 수왕사
天衾地席山爲枕(천금지석산위침)-하늘을 이불로, 땅을 자리로, 산을 베개를 삼고 / 月燭雲屛海作樽(월촉운병해작준)-달을 촛불로, 구름을 병풍으로, 바다를 술통으로 만들어 / 大醉居然仍起舞(대취거연잉기무)-크게 취하여 거연히 일어나 춤을 추니 / 却嫌長袖掛崑崙(각혐장수괘곤륜)-도리어 긴 소매자락이 곤륜산에 걸릴까 하노라. /
진묵대사의 유적고 내용이다. 진묵대사는 완주군과 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찰에 그 자취와 설화를 남기고 있다.
모악산에 위치한 대원사와 수왕사도 진묵대사의 설화와 이야기가 가득하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이번 주말 모악산으로 가보자. <편집자 주>
=========================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모악산
=========================
모악산의 주소는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일원이다. 반대로는 김제시와 접해있다.
일설에 따르면 모악산의 원래 이름은 금산이었을 것이라는 설도 있다. 이는 금산사란 절 이름에 근원을 두고 한 말이다.
그렇다면 금산(金山)이란 무슨 뜻인가. ‘큰산’을 한자음으로 표기했다는 설과 금산사 입구 금평호에서 사금이 나오기 때문에’금(金)’자가 들어갔다는 설로 갈리기도 한다. 또 모악산은 그 정상에 마치 어미가 어린애를 안고 있는 형태로 보이는 바위가 있어 이로부터 생겨난 이름이라는 설도 있다.
모악산은 한국의 곡창으로 불리는 김제와 만경평야를 그 발아래 두고 있다. 이들 벌판에 공급할 공업용수가 바로 모악산으로부터 흘러들기 때문이다. 특히 삼국시대 이전부터 관개시설의 대명사로 꼽혀 온 벽골제의 물이 그 물의 근원을 모악산에 두고 있음에랴. ‘징게맹경’의 젖줄이 바로 모악산에 닿아 있다. ‘어머니’산은 양육(養育)을 뜻한다. 그 품안에서 새 생명을 키워낸다.
동으로 구이저수지, 서로 금평저수지, 남으로 안덕저수지, 북으로 또 불선제, 중인제, 갈마제를 채우고 호남평야를 온통 적셔주는 젖꼭지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산이다. 정상에 올라 멀리 바라보면 동으로 전주가 발아래 있고, 남으로는 내장산, 서쪽으로는 변산반도가 멀리 보인다.
오른쪽 가지는 동남방으로 굽이쳐 흘러가 12절(마디)아래서 구성산을 이루었고, 그 너머로는 호남평야가 있다.
이 산은 정유재란과 동학농민봉기, 그리고 6·25등 숱한 재난을 거치는 동안에도 완주를 따뜻하게 품고 지켜냈다.
================
■대원사
================
모악산 동쪽 중턱에 위치한 대원사는 우리나라 불교의 5교 가운데 하나인 열반종을 세운 진덕화상의 제자였던 일승·심정·대원 등 세 승려가 세웠다고 하나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고 현재의 대웅전·명부전·산신삭 등은 조선후기 구한말의 건축물이다.
대웅전 안에는 중앙에 삼존불상이 있으며 불상 뒤에는 후불탱화와 나한탱화가 그려져 있다. 특히 삼존불상 앞에는 괴목으로 진묵대사가 만든 높이 90cm, 길이 135cm의 목각 사자상이 놓여 있고 스님들이 거처하는 방에는 진묵대사의 영정과 제왕탱화가 걸려있다.
대웅전 뒤편에는 높이 238cm의 고려시대 말기 작품인 5층 석탑이 남아 있다. 대원사 주위에는 6기의 부도가 있는데 이 가운데 높이 187cm의 탑모양을 한 용각부도는 두 마리의 큰용이 휘어감은 채 여의주를 서로 물려는 모습을 새겨 예술적 가치를 깊게 풍긴다.
△대원사 용각부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되어 있는 용각부도는 조각솜씨로 보아 고려시대에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높이는 132cm이며, 연꽃을 새긴 받침부 위에 배가 불룩한 원통형 몸체를 얹었다. 몸체에는 두마리의 큼직한 용과 띠모양 무늬, 연꽃무늬, 구름무늬 등을 조각했다. 몸체 위에는 거칠게 다듬은 지붕을 얹어 놓았다.
======================
■물의 왕 수왕사(水王寺)
======================
‘물의 왕’ 수왕사. 수왕사는 ‘물의 왕’이란 명성답게 물맛이 좋은 곳으로도 유명해 모악산을 찾는 등산객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이 절은 대원사에부터 산을 더 오르면 정상 인근에서 만나볼 수 있다.
원래 수왕사는 물왕이절 또는 무량(無量)이절이라고 불렸지만, 한자로 옮기면서 현재의 절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 절은 680년 고구려 보장왕 때 백제로 망명한 보덕(普德)화상이 수도의 도량으로 창건했다.
그 후 고려 인종 3년인 1125년에 원명국사(圓明國師)가 중창했고, 조선 선조 30년인 1597년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1604년에 진묵 일옥(一玉.1562∼1633)이 중창했다. 그러다 지난 1951년 공비를 토벌할 때 인법당으로 쓰였던 5칸짜리 건물 한 채와 산신각, 조사전 등이 모두 소각되었다.
6.25전쟁 때 공비 토벌 후 아무도 찾지 않던 절을 1953년에 주지인 석진(錫辰)스님이 중건했으며, 현재는 벽암(碧岩)스님이 주지를 맡아 꾸준한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웅전과 산신각·진묵영당(震默影堂)·요사채 등이 있으며, 유물로는 석가모니불상과 절 옆에 비스듬한 바위에 동초 김석곤선생이 지난 1900년에 새긴 ‘무량굴’이란 글과 시 한수가 전한다.
불상은 현재 대웅전에 봉안돼 있는데, 절을 창건할 때부터 있었다는 말과 진묵대사가 중창할 때 조성됐다는 말이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또 진묵영당 옆 바위틈에서는 옛 부터 피부병이나 신경통·위장병에 효험이 있다는 석간수가 흘러나온다.
‘수왕사약지(水王寺略誌)’에는 이 석간수에 대해 “옛날 선녀가 마시던 물”이라고 적혀 있으며, 진묵대사는 이 물이 눈처럼 차가워서 설수(雪水)라 불렀다고 한다.
특히 벽암 스님은 수왕사 주지에게만 전해 내려오는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전통사찰법주를 재현해 냈는데 오래 전부터 유명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수행할 때 기(氣)를 보충하기 위해 곡차를 만들어 왔으며, 수왕사의 전통 곡차인 송화백일주(松花百日酒)와 송죽오곡주(松竹五穀酒)는 12대 전승기능보유자인 스님에 이르러 전통사찰법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지난 1994년 8월 민속주 명인 제1호로 지정된 스님은 사라져가는 전통사찰 법주의 비법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송화양조’라는 작은 술도가(양조장)를 구이면에 차렸다.
진묵대사의 유적고 내용이다. 진묵대사는 완주군과 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찰에 그 자취와 설화를 남기고 있다.
모악산에 위치한 대원사와 수왕사도 진묵대사의 설화와 이야기가 가득하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이번 주말 모악산으로 가보자. <편집자 주>
=========================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모악산
=========================
모악산의 주소는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일원이다. 반대로는 김제시와 접해있다.
일설에 따르면 모악산의 원래 이름은 금산이었을 것이라는 설도 있다. 이는 금산사란 절 이름에 근원을 두고 한 말이다.
그렇다면 금산(金山)이란 무슨 뜻인가. ‘큰산’을 한자음으로 표기했다는 설과 금산사 입구 금평호에서 사금이 나오기 때문에’금(金)’자가 들어갔다는 설로 갈리기도 한다. 또 모악산은 그 정상에 마치 어미가 어린애를 안고 있는 형태로 보이는 바위가 있어 이로부터 생겨난 이름이라는 설도 있다.
모악산은 한국의 곡창으로 불리는 김제와 만경평야를 그 발아래 두고 있다. 이들 벌판에 공급할 공업용수가 바로 모악산으로부터 흘러들기 때문이다. 특히 삼국시대 이전부터 관개시설의 대명사로 꼽혀 온 벽골제의 물이 그 물의 근원을 모악산에 두고 있음에랴. ‘징게맹경’의 젖줄이 바로 모악산에 닿아 있다. ‘어머니’산은 양육(養育)을 뜻한다. 그 품안에서 새 생명을 키워낸다.
동으로 구이저수지, 서로 금평저수지, 남으로 안덕저수지, 북으로 또 불선제, 중인제, 갈마제를 채우고 호남평야를 온통 적셔주는 젖꼭지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산이다. 정상에 올라 멀리 바라보면 동으로 전주가 발아래 있고, 남으로는 내장산, 서쪽으로는 변산반도가 멀리 보인다.
오른쪽 가지는 동남방으로 굽이쳐 흘러가 12절(마디)아래서 구성산을 이루었고, 그 너머로는 호남평야가 있다.
이 산은 정유재란과 동학농민봉기, 그리고 6·25등 숱한 재난을 거치는 동안에도 완주를 따뜻하게 품고 지켜냈다.
================
■대원사
================
모악산 동쪽 중턱에 위치한 대원사는 우리나라 불교의 5교 가운데 하나인 열반종을 세운 진덕화상의 제자였던 일승·심정·대원 등 세 승려가 세웠다고 하나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고 현재의 대웅전·명부전·산신삭 등은 조선후기 구한말의 건축물이다.
 |
| ⓒ 완주군민신문 |
대웅전 안에는 중앙에 삼존불상이 있으며 불상 뒤에는 후불탱화와 나한탱화가 그려져 있다. 특히 삼존불상 앞에는 괴목으로 진묵대사가 만든 높이 90cm, 길이 135cm의 목각 사자상이 놓여 있고 스님들이 거처하는 방에는 진묵대사의 영정과 제왕탱화가 걸려있다.
대웅전 뒤편에는 높이 238cm의 고려시대 말기 작품인 5층 석탑이 남아 있다. 대원사 주위에는 6기의 부도가 있는데 이 가운데 높이 187cm의 탑모양을 한 용각부도는 두 마리의 큰용이 휘어감은 채 여의주를 서로 물려는 모습을 새겨 예술적 가치를 깊게 풍긴다.
△대원사 용각부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되어 있는 용각부도는 조각솜씨로 보아 고려시대에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높이는 132cm이며, 연꽃을 새긴 받침부 위에 배가 불룩한 원통형 몸체를 얹었다. 몸체에는 두마리의 큼직한 용과 띠모양 무늬, 연꽃무늬, 구름무늬 등을 조각했다. 몸체 위에는 거칠게 다듬은 지붕을 얹어 놓았다.
 |
| ⓒ 완주군민신문 |
======================
■물의 왕 수왕사(水王寺)
======================
‘물의 왕’ 수왕사. 수왕사는 ‘물의 왕’이란 명성답게 물맛이 좋은 곳으로도 유명해 모악산을 찾는 등산객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이 절은 대원사에부터 산을 더 오르면 정상 인근에서 만나볼 수 있다.
원래 수왕사는 물왕이절 또는 무량(無量)이절이라고 불렸지만, 한자로 옮기면서 현재의 절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
| ⓒ 완주군민신문 |
이 절은 680년 고구려 보장왕 때 백제로 망명한 보덕(普德)화상이 수도의 도량으로 창건했다.
그 후 고려 인종 3년인 1125년에 원명국사(圓明國師)가 중창했고, 조선 선조 30년인 1597년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1604년에 진묵 일옥(一玉.1562∼1633)이 중창했다. 그러다 지난 1951년 공비를 토벌할 때 인법당으로 쓰였던 5칸짜리 건물 한 채와 산신각, 조사전 등이 모두 소각되었다.
6.25전쟁 때 공비 토벌 후 아무도 찾지 않던 절을 1953년에 주지인 석진(錫辰)스님이 중건했으며, 현재는 벽암(碧岩)스님이 주지를 맡아 꾸준한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웅전과 산신각·진묵영당(震默影堂)·요사채 등이 있으며, 유물로는 석가모니불상과 절 옆에 비스듬한 바위에 동초 김석곤선생이 지난 1900년에 새긴 ‘무량굴’이란 글과 시 한수가 전한다.
불상은 현재 대웅전에 봉안돼 있는데, 절을 창건할 때부터 있었다는 말과 진묵대사가 중창할 때 조성됐다는 말이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또 진묵영당 옆 바위틈에서는 옛 부터 피부병이나 신경통·위장병에 효험이 있다는 석간수가 흘러나온다.
‘수왕사약지(水王寺略誌)’에는 이 석간수에 대해 “옛날 선녀가 마시던 물”이라고 적혀 있으며, 진묵대사는 이 물이 눈처럼 차가워서 설수(雪水)라 불렀다고 한다.
 |
| ⓒ 완주군민신문 |
 |
| ⓒ 완주군민신문 |
특히 벽암 스님은 수왕사 주지에게만 전해 내려오는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전통사찰법주를 재현해 냈는데 오래 전부터 유명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수행할 때 기(氣)를 보충하기 위해 곡차를 만들어 왔으며, 수왕사의 전통 곡차인 송화백일주(松花百日酒)와 송죽오곡주(松竹五穀酒)는 12대 전승기능보유자인 스님에 이르러 전통사찰법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지난 1994년 8월 민속주 명인 제1호로 지정된 스님은 사라져가는 전통사찰 법주의 비법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송화양조’라는 작은 술도가(양조장)를 구이면에 차렸다.
저작권자 완주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