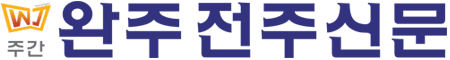more
 홈
특집/기획
홈
특집/기획
깊어가는 가을, 소양면으로 떠나는 의미 있는 여행길
임태호 기자
입력 2012.10.26 11:29
수정 2012.10.26 11:29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위봉산성·보물을 간직한 위봉사
문화적 가치도 높지만 가는 길 자체가 한 폭의 수채화
축제의 계절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다. 가족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축제를 다녀왔다면 이번 주말엔 조금은 더 한가해진 마음으로 역사를 찾아 떠나보는 여행을 추천한다.
특히 소양면은 천년고찰 송광사를 비롯해 위봉산성 그리고 비구니 사찰인 위봉사 등 다양한 문화제가 즐비하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부니 외투를 단단히 입고 자녀들과 함께 소양면으로 가보자. <편집자 주>
========================
■태조영정의 피난처 위봉산성
========================
위봉산성은 송광사에서 동상면 방향으로 발길을 돌리면 바로 만날 수 있다. 이 산성은 사적 471호(국가지정)로 지정되어 있고 구 주소로는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21번지 일원이다.
송광사에 동북쪽으로 3Km쯤 가면 원래 외성이라 했다는 오성마을이 나오고 여기서 추줄산을 돌고 돌아 1.5Km쯤 오르면 폐허상태에서 흔적만 남아 있는 위봉산성의 서문에 다다른다. 다행인 것은 문 위에 있었다는 3칸의 문주는 자취를 감췄지만 높이 3m 폭 3m의 홍예문이 남아있어 지방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점이다.
이 산성은 1675년 7년의 세월동안 인근 7개 군민을 동원하여 쌓은 것으로 국토방위라는 목적보다는 전주의 경기전에 있는 태조영정을 피난시키기 위해 만들어 졌다 결국 동학농민혁명 때 태조 영정을 이곳으로 피난, 산성축조의 목적을 달성한 바 있다.
-----------------------
△7개 군민을 동원 산성축조
-----------------------
당초의 성 규모는 길이 16Km 높이 4∼5m 폭 3m 의 석축이었고 3개소의 성문과 8개의 암문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극히 일부의 성벽과 동서북문 중 송광사 방향으로 향하는 서문만이 남아있다. 무지개문을 빠져나와 위봉마을을 지나면 옛날 52개의 말사를 거느린 호남의 모사(母寺) 위봉사가 있다.
====================
■보물을 간직한 위봉사
====================
위봉산성의 품에 안겨있는 위봉사는 604년(백제 무왕 5년)서암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하며 1359년(고려 공민왕 8년) 나옹화상이 중창했다고 한다.
현재의 건물들은 조선시대 건물이며 조선 세조때 포연선사가 쓴 극락전중수기를 보면 당시 규모가 전각 28동에 암자가 10동에 달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은 보물 제69호인 보광명전과 지방 문화재 제698호인 요사와 삼성각만이 남아있고 백의관음보살 벽화가 자랑거리이다. 현재도 이 절은 조계종 비구니의 수련장으로 확대, 중창되고 있다.
---------------
△위봉사 보광명전
---------------
보물 제 608호인 위봉사 보광명전은 다포계 양식으로 건축된 팔작집으로 굵직한 재목들을 사용해 집이 웅장하게 보이며 귀솟음도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공포는 내·외 모두 3출목이다. 쇠서의 조각 솜씨와 내·외부의 연화를 조각한솜씨 그리고 귀공포의 간결한 처리수법 및 보의 다듬은 기법 등으로 보아 17세기경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단 위에는 석가모니불과 좌우보살을 안치하였고 불상 위에는 낙양각과 운룡으로 장식된 화려한 닫집을 두었으며 가구는 1고주 7량으로 대들보위로는 우물천장을 가설했다. 별화를 그린 주악비천상이나 후불벽 뒷면에 그린 백의관음보살상 등은 색조가 차분하고 아늑한 금단청과 더불어 고식 채화의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다.
------------
△위봉사 요사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 69호로 지정되어 있는 위봉사 요사는 팔작지붕의 앞 뒤 건물 가운데를 맞배지붕으로 연결시켜 배치평면이 ‘Ⅰ’자 형을 이룬 특이한 배치를 하고 있다.
건물의 용도도 서로 달라 앞면은 관음전이고 뒷면은 요사로 사용되고 있다.
위봉사 극락전중수기에 의하면 조선 고종 5년(1868) 포련선사가 60여칸의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데, 가구의 짜임새로 보아 이 불전도 그 때 중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위봉사에는 묘법연화경판, 동국여지승람목각판이 보관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동국대학교 박물관과 국립전주박물관에 30여 쪽이 소장되어있다.
특히 소양면은 천년고찰 송광사를 비롯해 위봉산성 그리고 비구니 사찰인 위봉사 등 다양한 문화제가 즐비하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부니 외투를 단단히 입고 자녀들과 함께 소양면으로 가보자. <편집자 주>
========================
■태조영정의 피난처 위봉산성
========================
위봉산성은 송광사에서 동상면 방향으로 발길을 돌리면 바로 만날 수 있다. 이 산성은 사적 471호(국가지정)로 지정되어 있고 구 주소로는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21번지 일원이다.
송광사에 동북쪽으로 3Km쯤 가면 원래 외성이라 했다는 오성마을이 나오고 여기서 추줄산을 돌고 돌아 1.5Km쯤 오르면 폐허상태에서 흔적만 남아 있는 위봉산성의 서문에 다다른다. 다행인 것은 문 위에 있었다는 3칸의 문주는 자취를 감췄지만 높이 3m 폭 3m의 홍예문이 남아있어 지방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점이다.
 |
| ⓒ 완주군민신문 |
이 산성은 1675년 7년의 세월동안 인근 7개 군민을 동원하여 쌓은 것으로 국토방위라는 목적보다는 전주의 경기전에 있는 태조영정을 피난시키기 위해 만들어 졌다 결국 동학농민혁명 때 태조 영정을 이곳으로 피난, 산성축조의 목적을 달성한 바 있다.
-----------------------
△7개 군민을 동원 산성축조
-----------------------
당초의 성 규모는 길이 16Km 높이 4∼5m 폭 3m 의 석축이었고 3개소의 성문과 8개의 암문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극히 일부의 성벽과 동서북문 중 송광사 방향으로 향하는 서문만이 남아있다. 무지개문을 빠져나와 위봉마을을 지나면 옛날 52개의 말사를 거느린 호남의 모사(母寺) 위봉사가 있다.
 |
| ⓒ 완주군민신문 |
====================
■보물을 간직한 위봉사
====================
위봉산성의 품에 안겨있는 위봉사는 604년(백제 무왕 5년)서암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하며 1359년(고려 공민왕 8년) 나옹화상이 중창했다고 한다.
 |
| ⓒ 완주군민신문 |
현재의 건물들은 조선시대 건물이며 조선 세조때 포연선사가 쓴 극락전중수기를 보면 당시 규모가 전각 28동에 암자가 10동에 달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은 보물 제69호인 보광명전과 지방 문화재 제698호인 요사와 삼성각만이 남아있고 백의관음보살 벽화가 자랑거리이다. 현재도 이 절은 조계종 비구니의 수련장으로 확대, 중창되고 있다.
---------------
△위봉사 보광명전
---------------
보물 제 608호인 위봉사 보광명전은 다포계 양식으로 건축된 팔작집으로 굵직한 재목들을 사용해 집이 웅장하게 보이며 귀솟음도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
| ⓒ 완주군민신문 |
공포는 내·외 모두 3출목이다. 쇠서의 조각 솜씨와 내·외부의 연화를 조각한솜씨 그리고 귀공포의 간결한 처리수법 및 보의 다듬은 기법 등으로 보아 17세기경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
| ⓒ 완주군민신문 |
불단 위에는 석가모니불과 좌우보살을 안치하였고 불상 위에는 낙양각과 운룡으로 장식된 화려한 닫집을 두었으며 가구는 1고주 7량으로 대들보위로는 우물천장을 가설했다. 별화를 그린 주악비천상이나 후불벽 뒷면에 그린 백의관음보살상 등은 색조가 차분하고 아늑한 금단청과 더불어 고식 채화의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다.
 |
| ⓒ 완주군민신문 |
------------
△위봉사 요사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 69호로 지정되어 있는 위봉사 요사는 팔작지붕의 앞 뒤 건물 가운데를 맞배지붕으로 연결시켜 배치평면이 ‘Ⅰ’자 형을 이룬 특이한 배치를 하고 있다.
건물의 용도도 서로 달라 앞면은 관음전이고 뒷면은 요사로 사용되고 있다.
위봉사 극락전중수기에 의하면 조선 고종 5년(1868) 포련선사가 60여칸의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데, 가구의 짜임새로 보아 이 불전도 그 때 중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위봉사에는 묘법연화경판, 동국여지승람목각판이 보관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동국대학교 박물관과 국립전주박물관에 30여 쪽이 소장되어있다.
저작권자 완주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